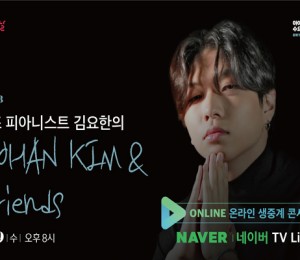박하 - 치통, 피부소양 등을 치료 - 약초이야기

- 11-25
- 977 회
- 0 건
박하는 향기를 간직한 약용식물이다. 웬만한 허브식물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향기가 진하며 심지어 바싹 말라죽은 것 조차도 일년이 넘게 향기가 남아 건드리기만 해도 알싸하고 매력적인 내음으로 퍼저나온다.
은단처럼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박하사탕과 박하향 짙은 치약·담배도 우리에게 친숙한 기호품이다.
야식향, 번하채, 승양채, 인단초, 영생이라고 불리는 박하는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비교적 습지에 자생하며 뿌리를 통해 번식한다. 풀 전체에 털이 나있고 줄기는 모가 나있다. 7~9월에 줄기의 윗쪽 잎겨드랑이에 담자색 또는 흰색의 꽃잎이 모여 이삭모양으로 꽃이 핀다.
박하의 크기는 영양 상태와 수분의 공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30㎝에서 80㎝내외까지 자라며 잎은 장타원형으로 우리나라의 것은 끝부분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다. 잎 표면에는 기름샘이 있어 잎을 건드리거나 마찰하면 박하 특유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
박하의 성분은 정유를 함유하고 있는데 주성분이 멘톨(menthol)이고 멘톤(menthone) 캄펜(camphene) 리모넨(limone) 등이 들어있다. 박하는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크게 나누지만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는 학설에서는 태고시대에 중국에서 인도를 거쳐 유럽에 전파된 것이 서양박하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서양박하는 정유의 성질에 따라 페퍼먼트, 스피어민트, 페니로열민트로 구분되고 동양종은 일본박하라고 하는데 줄기가 붉은 적경종(赤莖種)과 그렇지 않은 청경종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된 품종은 청경종과 적경종으로 방향이 좋지 못하다.
이 박하는 기원전 1000~600년경에 이집트에서 재배한 흔적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재배됐고 채유를 목적으로 1750년경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물공전(博物公典)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보아 수천년전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민가에서도 옛부터 약용으로 재배했다. 특히 박하를 「영생(英生)」이라고 해서 나물을 해먹기 위해 채소밭에 심었다는 내용이 본초서(本草書)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1910년경부터는 약용이나 식용보다는 채유를 위해 재배되기 시작했고 1960년을 전후해 작물시험장에서 우량품종을 개발,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박하의 약학적 응용은 동양의학에서와 현대 약학적인 응용에 있어 그 영역이 다르다.
동양의학에서는 풍사(風邪)를 막고 산열, 해표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한방에서 풍열, 두통, 인후종통, 복부고창, 치통, 피부소양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본초서에는 독한(毒寒)을 몰아내고 상한(傷寒)의 두통을 다스린다. 중풍, 두풍을 없애고 피로를 풀어준다. 또 풍과 열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한다. 담 있는 기침, 피부병을 다스리고 허한 사람은 많이 못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민간요법으로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거나 감기로 목이 잠기면 박하 잎을 끓는 물에 울궈내어 꿀을 타 마시도록했는데 신기하게 잘 나았다고 한다.
현대 약학에서는 박하에 함유돼 있는 멘탈을 두통, 신경통, 소양증 등에 사용하고, 멘톤은 동물장관 운동을 억제하는데 응용한다. 박하를 정유한 박하유와 이를 저온처리 한 박하뇌는 흥분 건위 진통 방향 청량제로, 멘톨을 치약 잼 사탕 화장품 담배 등에 청량제나 향료로 쓴다.
- 경남신문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