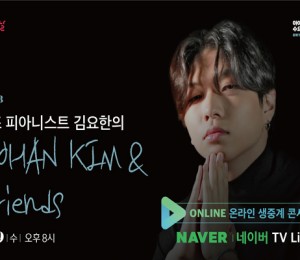적반하장(賊反荷杖) - 고전속지혜

- 홈지기 (114.♡.11.73)
- 08-19
- 803 회
- 0 건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울러멘다.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친다. 고사성어(故事成語)하면 의례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우리 나라에서 오래 동안 쓰여져 온 것도 적지 않다. `적반하장(賊反荷杖)`,`오비이락(烏飛梨落 : 가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동족방뇨(凍足放尿 : 언 발에 오줌 누기)` 등이 그 예이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이,생활의 지혜를 담아 어떤 상황을 절묘(絶妙)하게 축약하여 표현한 말이다.
이 외에 꼭 이런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아니지만,우리 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속담(俗談)이나 격언(格言) 등을 한자(漢字)로 번역하여 둔 것도 있다. 성호(星湖) 이익(李瀷)선생이 지은 백언해(百諺解),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선생의 이담속찬(耳談續纂) 등의 책은,우리 나라 속담을 한자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현묵자(玄?子) 홍만종(洪萬宗)의 순오지(旬五志),조수삼(趙秀三)의 송남잡지(松南雜識) 등에도 한자로 번역된 속담이 실려 있다.
어떤 도둑이 남이 집에 물건을 훔치려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들켰다. 주인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이웃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때 도둑이 몽둥이를 울러메고 “도둑 잡아라”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도둑 잡는 시늉을 하자,컴컴한 밤에 이웃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그가 도둑인 줄을 알 턱이 없다는 말이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남의 눈을 속이며 우기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목수를 불러서 자기 집의 대문에 빗장을 달게 했다. 그런데 그 목수는 좀 모자라는 목수인지라,빗장을 대문 바깥에다 달아놓았다. 일을 다했다고 주인에게 일 싻을 달라고 하기에,주인이 일을 점검해 보니,어이가 없었다. 빗장이 바깥에 달려 있어,잠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 있었다. “이 따위 바보 같은 목수가 있어? 당신 눈은 두어 무엇 해?”라고 주인이 화를 내자,그 목수는,“나 같은 목수를 불러 일을 시킨 당신의 눈은 두어 무엇하오?”라고 대들었다. 적반하장격이지만,이 목수는 말을 잘 받아쳤다.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남에게 그 잘못을 전가(轉嫁)시키는 사람이 많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제삼자는 그 내면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한 사람을 편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약자(弱者)의 인권(人權)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된 시민단체들이,한 편의 말만 듣고서 편들다가 상대편의 평생을 망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남의 일을 판단할 때는 섣불리 해서는 안되고 신중(愼重)을 기해야 하겠다.
흔히 우리는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두고,“둘이 똑 같으니까 싸우지”라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이 역시 잘못된 말이다. 두 사람이 똑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또 한 쪽이 옳고,한 쪽은 잘못된 경우도 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여러 단체나 인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올바른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잘못을 하고서도 교묘하게 자기의 잘못을 숨기는 사람은 그 잘못이 드러나도록 해야겠다.
(*. 賊 : 도적, 적. *. 反 : 도리어, 반. *. 荷 : 멜, 하. 연꽃, 하. *. 杖 : 몽둥이, 장. 지팡이, 장)
- 경남신문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